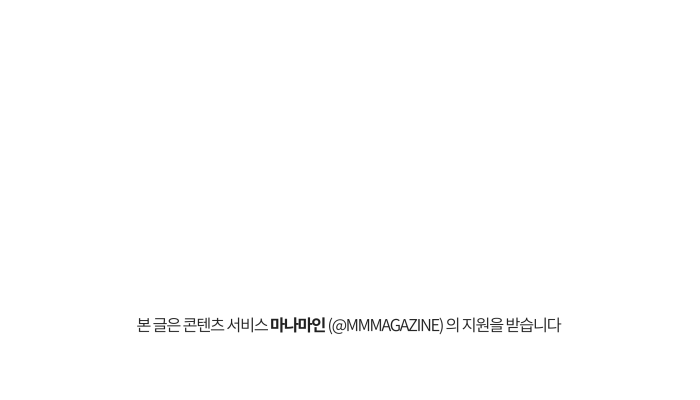다섯 살 딸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. 주인공 아이가 무서울 때 뭔가를 상상으로 불러낸다는 내용이었다. 거대한 거인이 잠이 든 아이를 지켜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.
책을 다 읽고 딸에게, "우리 딸은 무서울 때 뭘 부르고 싶니?" 라고 물었다. 딸은 너구리를 부르겠다고 답했다. 너구리는 요즘 딸이 좋아하는 팔뚝만한 인형이다. 난 다시 물었다. "이 책의 주인공은 자기를 지켜달라고 큰 거인을 불렀는데, 너는 (작은) 너구리를 부를 거야?" "응. 너구리를 꼭 안을 거야. 호랑이도 불러서 꼭 안을 거야." 호랑이도 팔뚝만한 인형이다.
난 그림책에서처럼 힘이 센 뭔가를 곁에 두었을 때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, 어쩌면 딸의 생각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. 우리는 힘 센 뭔가가 아니라, 우리처럼 작지만 친숙하고 따뜻한 대상을 통해 두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말이다. 거대한 몸집 대신,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. 서로가 얼마나 작고 약한지는 문제되지 않는다.
혼자였을 때, 세상이 두렵고 한없이 작았던 소녀와 소년은, 자기보다 작은 아기를 안고 온기를 느끼며 이전보다 조금 더 용감해진다. 호위 무사나 큰 가드가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. 나를 사랑하는 작고 연약한 아이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. 그래서 무섭고 막막할 때, 세 살 다섯 살 아이들을 꼭 끌어 안는다. 자주 안는다. 하나님께서 거인대신 아이를 곁에 두신 이유다.
세상은 나를 지켜줄 히어로를 원하고, 온갖 히어로가 극장가를 점령했지만, 실제 세상이 무서움을 떨쳐낼 수 있는 이유는 눈 먼 내 등을 타고 있는 앉은뱅이 친구 때문이요, 내 품에 안긴 작고 연약한 너구리 때문이다.